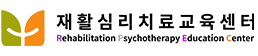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때문에 건물이 엉망이라고?
페이지 정보
RPEC 0 Comments 159 Views 25-03-04 10:38본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때문에 건물이 엉망이라고?
장애인화장실 내부사진은 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인해 모든 공공건물들은 BF 인증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해 장애인만이 편리한 것은 아니다. 노인이나 임산부 등은 물론 편의증진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부상자나 환자만이 아니라 전혀 장애와 무관한 비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라 했으니,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으나 “등”의 위력은 대단하다.
비장애인이 편한 것은 비장애인도 편하다. 턱이 없으면 실수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나 피난안전을 위한 고려는 모두가 편리할 것이다. 용무가 매우 급한 상황에서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아 장애인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 있을 때에도 편의시설의 혜택을 본 경우가 된다. 사실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장애인화장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일 뿐,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장애인만 이용하는 전용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용자가 거의 없다며 청소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BF 인증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망치고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건물 입구의 턱 높이를 제거하다 보니, 비가 오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며 BF가 건물을 망쳤다고 한다. 홍수라도 나면 건물 내부 시설은 침수 상태가 된다고 한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건물의 하자를 BF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캐노피(우수와 채광을 막기 위한 시설)를 충분히 확보하고,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물굽이(물구베)를 확보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수로(트랜치)를 만들어 물의 유입을 방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턱이 없어 물난리가 난 것은 아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배수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출입구 턱 설치 방식만 고집하다가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BF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 아니다.
남녀 화장실의 문이 없어 BF 탓을 하기도 한다. 문의 통과폭이 90센티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문설주 등으로 폭이 부족하여 문을 뜯는다. 문의 날개벽이 60센티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날개벽이 없어 문을 뜯는 경우도 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붙어 있거나 매우 가까운 경우 여성들은 불안하다. 화장실에서 소음이 밖에서 들린다거나, 외부에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문이 없으니 커튼으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BF를 원망한다. 건축물은 항상 규정상 치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유치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하여 BF 인증에 미달하게 된다. 벽을 허물 수도 없고 자동문으로 하려니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단순히 문을 제거해 버린 결과이다. 이 경우도 BF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 설계자가 여유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시공자가 오차를 발생시킨 이유이다. 아무리 여유치수를 확보하라고 강조를 해도 법에 여유치수를 확보하란 말이 없는데 법대로 한 것을 왜 시비를 거느냐고 띠지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치수가 부족하여 문을 제거한 것이다.
BF는 치수를 확보하라는 것이지 문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을 제거하여 치수를 억지로 맞춘 설계나 시공이 문제인 것이다. 결코 BF의 잘못이 아니다. BF가 건물의 품질과 품격을 오히려 상당히 향상되도록 기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전 고려를 하지 못하다가 억지로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자, 벽을 허물어 새로이 공사하기에는 비용이 들자, 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버린 것은 시공자나 건물주이다. 이는 BF와는 무관하다.
화장실만이 아니라 출입문에서 문 폭이 부족하거나 날개벽을 확보하지 못하여 BF를 원망하거나 BF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제 건축 설계자가 문폭이나 날개벽 치수 확보 정도는 기본인데, 그런 기본도 갖추지 못한 설계가 문제이지, BF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는 관리자 동선이니 BF 심의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한다. 그리고 용도를 창고로 만들어 버린다. 또는 모두가 이용하기 위해 베란다를 만들어 놓고 출입금지 안내판을 붙인다. BF로 인해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건축문화나 설계나 시공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건물이 엉망이 된 것이다.

강당 단상(사진은 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강당의 무대 높이가 높아야 좌석에 앉은 모든 사람이 보기가 편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단을 높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져서 공간을 경사로에 내어 주어야 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불편하다. BF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모두가 편한 시설물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수준의 부족이고, 건축물 디자인의 수준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높은 단은 권위주의의 산물일 수 있다. 그리고 경사로를 관람석 중앙을 지나가도록 하거나, 벽을 둘러 흉물이 되도록 한 곳이 많다. 무대의 경사로를 방향을 바꾸어 무대 수평으로 설치하면서 오히려 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은 상당히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다.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여 모두가 편한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인색하게 설계하고 불편하게 설계하고 좁고 다닥다닥하게 설계하여 날개벽도 나오지 않는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때문에 건축물을 망쳤다는 핑계는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이다.
최근 편의시설로 인해 건물을 망쳤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는 언론이 제대로 된 건축설계를 하도록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조장하는 잘못된 보도 형태이다.
시티투어 버스에 장애인도 탑승을 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장애인은 탈 수 없으니 차별이라고 주장하자, 그러면 시티투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시티투어가 없으니 차별이 아닌 것이 된다며 있던 시티투어를 없애 버린 도시가 있었다. 시민들은 장애인 때문에 시티투어가 없어졌다고 화를 낸다. 정치가 서로 공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도록 조장한 결과이다.
이런 정치인의 얄팍한 꼼수가, 그리고 건축주나 설계자의 부실한 건축설계와 건축문화의 부족, 편의시설의 인식 부족에서 불편하고 나쁜 시설물들이 나온 것이다. BF 때문이 아니라 BF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다가 생긴 것이 불편시설이 된 것이다.
옥상에 장애인 접근이 되지 않아 정원으로 사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시킨다면 접근을 해결하면 될 것을 옥상 전체의 활용을 포기하는 건축주의 잘못인지, 장애인도 함께 이용하자는 주장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일보가 지적한 천안 아산역 지식산업센터의 화장실이 BF로 인해 문이 제거되어 불편하다는 보도는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BF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고, 사후 BF 기준에 미달이 되자 문을 뜯고 사용하겠다고 방안을 고안한 것은 건물 관계자였던 것이다.
자동문을 설치하거나 문의 폭을 확장하여 문을 달아야 했던 것을 임시방편을 추구한 것은 BF가 아니라 건물 관계자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공 건축물은 장애인 이용 가능성이나 빈도와 무관하게 BF인증 대상 건축물이라는 상식조차도 모르는 건축계를 꼬집어야 했을 보도를 장애인 탓을 한 보도가 유감스럽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인해 모든 공공건물들은 BF 인증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해 장애인만이 편리한 것은 아니다. 노인이나 임산부 등은 물론 편의증진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부상자나 환자만이 아니라 전혀 장애와 무관한 비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라 했으니,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으나 “등”의 위력은 대단하다.
비장애인이 편한 것은 비장애인도 편하다. 턱이 없으면 실수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나 피난안전을 위한 고려는 모두가 편리할 것이다. 용무가 매우 급한 상황에서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아 장애인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 있을 때에도 편의시설의 혜택을 본 경우가 된다. 사실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장애인화장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일 뿐,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장애인만 이용하는 전용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용자가 거의 없다며 청소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BF 인증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망치고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건물 입구의 턱 높이를 제거하다 보니, 비가 오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며 BF가 건물을 망쳤다고 한다. 홍수라도 나면 건물 내부 시설은 침수 상태가 된다고 한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건물의 하자를 BF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캐노피(우수와 채광을 막기 위한 시설)를 충분히 확보하고,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물굽이(물구베)를 확보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수로(트랜치)를 만들어 물의 유입을 방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턱이 없어 물난리가 난 것은 아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배수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출입구 턱 설치 방식만 고집하다가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BF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 아니다.
남녀 화장실의 문이 없어 BF 탓을 하기도 한다. 문의 통과폭이 90센티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문설주 등으로 폭이 부족하여 문을 뜯는다. 문의 날개벽이 60센티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날개벽이 없어 문을 뜯는 경우도 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붙어 있거나 매우 가까운 경우 여성들은 불안하다. 화장실에서 소음이 밖에서 들린다거나, 외부에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문이 없으니 커튼으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BF를 원망한다. 건축물은 항상 규정상 치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유치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하여 BF 인증에 미달하게 된다. 벽을 허물 수도 없고 자동문으로 하려니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단순히 문을 제거해 버린 결과이다. 이 경우도 BF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 설계자가 여유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시공자가 오차를 발생시킨 이유이다. 아무리 여유치수를 확보하라고 강조를 해도 법에 여유치수를 확보하란 말이 없는데 법대로 한 것을 왜 시비를 거느냐고 띠지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치수가 부족하여 문을 제거한 것이다.
BF는 치수를 확보하라는 것이지 문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을 제거하여 치수를 억지로 맞춘 설계나 시공이 문제인 것이다. 결코 BF의 잘못이 아니다. BF가 건물의 품질과 품격을 오히려 상당히 향상되도록 기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전 고려를 하지 못하다가 억지로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자, 벽을 허물어 새로이 공사하기에는 비용이 들자, 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버린 것은 시공자나 건물주이다. 이는 BF와는 무관하다.
화장실만이 아니라 출입문에서 문 폭이 부족하거나 날개벽을 확보하지 못하여 BF를 원망하거나 BF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제 건축 설계자가 문폭이나 날개벽 치수 확보 정도는 기본인데, 그런 기본도 갖추지 못한 설계가 문제이지, BF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는 관리자 동선이니 BF 심의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한다. 그리고 용도를 창고로 만들어 버린다. 또는 모두가 이용하기 위해 베란다를 만들어 놓고 출입금지 안내판을 붙인다. BF로 인해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건축문화나 설계나 시공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건물이 엉망이 된 것이다.
강당 단상(사진은 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강당의 무대 높이가 높아야 좌석에 앉은 모든 사람이 보기가 편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단을 높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져서 공간을 경사로에 내어 주어야 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불편하다. BF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모두가 편한 시설물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수준의 부족이고, 건축물 디자인의 수준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높은 단은 권위주의의 산물일 수 있다. 그리고 경사로를 관람석 중앙을 지나가도록 하거나, 벽을 둘러 흉물이 되도록 한 곳이 많다. 무대의 경사로를 방향을 바꾸어 무대 수평으로 설치하면서 오히려 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은 상당히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다.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여 모두가 편한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인색하게 설계하고 불편하게 설계하고 좁고 다닥다닥하게 설계하여 날개벽도 나오지 않는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때문에 건축물을 망쳤다는 핑계는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이다.
최근 편의시설로 인해 건물을 망쳤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는 언론이 제대로 된 건축설계를 하도록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조장하는 잘못된 보도 형태이다.
시티투어 버스에 장애인도 탑승을 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장애인은 탈 수 없으니 차별이라고 주장하자, 그러면 시티투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시티투어가 없으니 차별이 아닌 것이 된다며 있던 시티투어를 없애 버린 도시가 있었다. 시민들은 장애인 때문에 시티투어가 없어졌다고 화를 낸다. 정치가 서로 공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도록 조장한 결과이다.
이런 정치인의 얄팍한 꼼수가, 그리고 건축주나 설계자의 부실한 건축설계와 건축문화의 부족, 편의시설의 인식 부족에서 불편하고 나쁜 시설물들이 나온 것이다. BF 때문이 아니라 BF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다가 생긴 것이 불편시설이 된 것이다.
옥상에 장애인 접근이 되지 않아 정원으로 사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시킨다면 접근을 해결하면 될 것을 옥상 전체의 활용을 포기하는 건축주의 잘못인지, 장애인도 함께 이용하자는 주장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일보가 지적한 천안 아산역 지식산업센터의 화장실이 BF로 인해 문이 제거되어 불편하다는 보도는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BF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고, 사후 BF 기준에 미달이 되자 문을 뜯고 사용하겠다고 방안을 고안한 것은 건물 관계자였던 것이다.
자동문을 설치하거나 문의 폭을 확장하여 문을 달아야 했던 것을 임시방편을 추구한 것은 BF가 아니라 건물 관계자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공 건축물은 장애인 이용 가능성이나 빈도와 무관하게 BF인증 대상 건축물이라는 상식조차도 모르는 건축계를 꼬집어야 했을 보도를 장애인 탓을 한 보도가 유감스럽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